회원글 나눔 | 숲길에서 만난 작은 생명들
페이지 정보
고양지회 작성일20-11-01 15:39 조회478회 댓글0건본문
길에서 만난 작은 생명들
박병희(흙마음)
청설모
9월 초입 어느 날, 집 근처 숲길로 산책을 나갔다가 오는 길에 마침 바로 발 앞에 밤송이가 톡 떨어졌다. 밤송이 한 쪽이 뜯긴 상태여서 ‘청설모가 떨어트렸나?’ 하고 위를 살펴보니 밤나무 위에 청설모가 안 보인다. 잘 됐다 싶어서 발로 밟아서 가시를 없애고 안을 보니 아직 덜 익어서 채 갈색으로 물들지 않은 밤톨이 두 개 남아있다. 아마 하나를 꺼내서 나뭇가지 위에서 까먹다가 밤송이가 떨어진 모양이다.
마침 배가 좀 고프던 참이라 하얀 밤톨 두 알을 손에 쥐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살펴보니 밤나무 가지에 청설모가 한 마리 앉아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다.
“내꺼 내놔~~~~!”
“그래~~” 하며 보는데서 밤톨을 두 알 다 던져주고 지켜봐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 등산통로라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곳인데....
마침 위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귀에 걸기만 하고 있는(KF94라 답답해서 잠시 한 쪽을 내린 상태) 나를 보고는 입을 막고 급히 지나가느라 다행히 바닥에 있는 밤을 못 봤다.
밤톨 두 개를 주워서 청설모가 보는 앞에서 다시 던져줘도 포기했는지 별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그냥 집어왔다. 청설모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아직 덜 익어 물이 많고 연한 햇밤이 오도독...........
어찌나 맛있던지....!
숲길에서 좀 떨어진 덤불 속에 던져주었다면 청설모가 내려왔을까?
그랬다간 괜히 나도 못 먹고 청설모도 못 찾아먹게 되진 않았을까?
청설모가 먹다 떨어트린 밤을 주워서 먹어버리다니....
어린 아이 과자 빼앗아 먹고 울린 기분이 이럴까.... 좀 부끄럽고 한심한... 참내....!
흰배멧새
시월도 벌써 열흘은 지나가버린 어느 날.
늘 그렇듯이 지각할까봐 큰 보폭에다 빠른 걸음으로 날 듯이 이말산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사잇길인 지름길을 가고 있었다. 왼쪽의 정원과 오른쪽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는 아스콘 산책로를 가는데 길 가운데 참새 같은 것이 한 마리 앉아있다. 내가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곧 쓰러질 듯이 몸이 한쪽으로 몹시 기운 상태로 가만히 있다. 살그머니 집어 올려도 가만히 있다. 왼손바닥에 놓으려는 찰나에 20그램이나 될까.. 가벼운 몸피와 체온을 느낄 사이도 없이 갑자기 파드득 날아오르는가 했더니 2미터 쯤 날아가 추락하듯이 회양목 울타리 아래 내려앉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도 역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 더 가까이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지체한 시간만큼 빨리 가야하는데 마음은 온통 회양목 아래 두고 온 작은 새에게 가 있다. 날 수 있을 만큼 몸은 성한데 어디가 아플까? 유리창에 실수로 살짝 부딪쳤을까? 처음 발견된 곳이 아파트 입구 유리창 앞이었는데... 좀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날아갈 수 있으려나?
아파트에는 길고양이들도 많은데 고양이들 눈에 덜 띄게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올 걸 그랬나? 나뭇잎이 많은 가지에 올려놓으면 기력을 차릴 때까지 안전하게 쉴 수 있을텐데... 할머니 손 잡고 나온 애들도 금방 찾아낼텐데... 애들이 눈이 얼마나 밝은데...왜 그때는 나뭇가지에 올려놓을 생각을 못했지? 항상 뒷북을 친다. 순발력은 제로.
모쪼록 길고양이들이나 아이들 눈에 뜨이기 전에 기운을 차려서 안전하게 숲으로 날아가기를......!
아기 나무
10월 하순 초입 어느날 아침 조깅 길에서 너무나 작은 생강나무를 만났다. 지금까지 봐 온 어린 생강나무 중에서 제일 작아서 키가 5 센티도 채 안 되는 아기 생강나무. 올해 싹 트고 자란 것이 나뭇잎 두 장을 달고 있다. 나뭇잎이라야 크기가 겨우 동전만한데 그래도 생강나무라고 한 장은 하트 모양, 또 한 장은 엄지를 내밀고 있는 모양이다. 가을이라고 노랗게 단풍이든 잎의 겨드랑이에는 기특하게도 내년을 기약하는 겨울눈을 하나씩 달고 있다. 그런데 하필 뿌리를 내린 곳이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산길의 비탈이라 밟히기 십상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도 자리한 곳이 잘게 바스러져가는 바위 위라 잔돌 투성이.... 삽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용케 뿌리를 내렸는지 신기할 지경.
어느 봄날에 돌 틈에 묻혀있던 씨앗에서 어렵게 싹을 티웠는가 본데 흙 알갱이도 별로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나는 왜 못 봤을까? 평균 주 2,3회를 오르내리는 곳인데... 더구나 생강나무를 발견한 곳은 내리막 구간이라 항상 발 딛는 곳을 확인하고 조심해서 저속으로 달리는 구간인지라 늘 살피는데도 노랗게 단풍이 들고서야 내 눈에 띄었다. 얼마나 작은 몸인지...
겨울이 되어 눈이라도 내리면 오솔길도 표시나지 않아서 투박한 등산화에 밟히기 십상이고 스치기만 해도 그 연약한 가지는 바로 부러질텐데...
사진만 두 장 찍고 그냥 내려갔는데 그 조그만 생강나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틀 뒤 아침, 이번에는 마음먹고 그 생강나무를 찾아보려고 내려가는 길에 내내 주의를 기울였건만 찾지 못했다. 다시 8부 능선까지 두 번이나 더 오르내렸으나 그 사이에 노랗게 단풍 든 잎이 떨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노란 잎은 떨어지고 이쑤시개보다도 짧고 가는 가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또다시 3일 후, 이번에는 꼭 찾고 말리라 다짐하며 내리막길 초입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집중해서 찾다가 나뭇잎을 몇 장 모아 쥐고 쌓여있는 낙엽을 쓸면서 찾았다. 빠짐없이 다 쓸면서 내려왔건만 결국 헛수고만 하고 말았다. 운 좋게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기고 봄에 새 잎을 틔울 수 있을까?
첫 돌을 지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려나?
박병희(흙마음)
청설모
9월 초입 어느 날, 집 근처 숲길로 산책을 나갔다가 오는 길에 마침 바로 발 앞에 밤송이가 톡 떨어졌다. 밤송이 한 쪽이 뜯긴 상태여서 ‘청설모가 떨어트렸나?’ 하고 위를 살펴보니 밤나무 위에 청설모가 안 보인다. 잘 됐다 싶어서 발로 밟아서 가시를 없애고 안을 보니 아직 덜 익어서 채 갈색으로 물들지 않은 밤톨이 두 개 남아있다. 아마 하나를 꺼내서 나뭇가지 위에서 까먹다가 밤송이가 떨어진 모양이다.
마침 배가 좀 고프던 참이라 하얀 밤톨 두 알을 손에 쥐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살펴보니 밤나무 가지에 청설모가 한 마리 앉아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다.
“내꺼 내놔~~~~!”
“그래~~” 하며 보는데서 밤톨을 두 알 다 던져주고 지켜봐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 등산통로라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곳인데....
마침 위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귀에 걸기만 하고 있는(KF94라 답답해서 잠시 한 쪽을 내린 상태) 나를 보고는 입을 막고 급히 지나가느라 다행히 바닥에 있는 밤을 못 봤다.
밤톨 두 개를 주워서 청설모가 보는 앞에서 다시 던져줘도 포기했는지 별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그냥 집어왔다. 청설모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아직 덜 익어 물이 많고 연한 햇밤이 오도독...........
어찌나 맛있던지....!
숲길에서 좀 떨어진 덤불 속에 던져주었다면 청설모가 내려왔을까?
그랬다간 괜히 나도 못 먹고 청설모도 못 찾아먹게 되진 않았을까?
청설모가 먹다 떨어트린 밤을 주워서 먹어버리다니....
어린 아이 과자 빼앗아 먹고 울린 기분이 이럴까.... 좀 부끄럽고 한심한... 참내....!
흰배멧새
시월도 벌써 열흘은 지나가버린 어느 날.
늘 그렇듯이 지각할까봐 큰 보폭에다 빠른 걸음으로 날 듯이 이말산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사잇길인 지름길을 가고 있었다. 왼쪽의 정원과 오른쪽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는 아스콘 산책로를 가는데 길 가운데 참새 같은 것이 한 마리 앉아있다. 내가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곧 쓰러질 듯이 몸이 한쪽으로 몹시 기운 상태로 가만히 있다. 살그머니 집어 올려도 가만히 있다. 왼손바닥에 놓으려는 찰나에 20그램이나 될까.. 가벼운 몸피와 체온을 느낄 사이도 없이 갑자기 파드득 날아오르는가 했더니 2미터 쯤 날아가 추락하듯이 회양목 울타리 아래 내려앉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도 역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 더 가까이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지체한 시간만큼 빨리 가야하는데 마음은 온통 회양목 아래 두고 온 작은 새에게 가 있다. 날 수 있을 만큼 몸은 성한데 어디가 아플까? 유리창에 실수로 살짝 부딪쳤을까? 처음 발견된 곳이 아파트 입구 유리창 앞이었는데... 좀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날아갈 수 있으려나?
아파트에는 길고양이들도 많은데 고양이들 눈에 덜 띄게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올 걸 그랬나? 나뭇잎이 많은 가지에 올려놓으면 기력을 차릴 때까지 안전하게 쉴 수 있을텐데... 할머니 손 잡고 나온 애들도 금방 찾아낼텐데... 애들이 눈이 얼마나 밝은데...왜 그때는 나뭇가지에 올려놓을 생각을 못했지? 항상 뒷북을 친다. 순발력은 제로.
모쪼록 길고양이들이나 아이들 눈에 뜨이기 전에 기운을 차려서 안전하게 숲으로 날아가기를......!
아기 나무
10월 하순 초입 어느날 아침 조깅 길에서 너무나 작은 생강나무를 만났다. 지금까지 봐 온 어린 생강나무 중에서 제일 작아서 키가 5 센티도 채 안 되는 아기 생강나무. 올해 싹 트고 자란 것이 나뭇잎 두 장을 달고 있다. 나뭇잎이라야 크기가 겨우 동전만한데 그래도 생강나무라고 한 장은 하트 모양, 또 한 장은 엄지를 내밀고 있는 모양이다. 가을이라고 노랗게 단풍이든 잎의 겨드랑이에는 기특하게도 내년을 기약하는 겨울눈을 하나씩 달고 있다. 그런데 하필 뿌리를 내린 곳이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산길의 비탈이라 밟히기 십상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도 자리한 곳이 잘게 바스러져가는 바위 위라 잔돌 투성이.... 삽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용케 뿌리를 내렸는지 신기할 지경.
어느 봄날에 돌 틈에 묻혀있던 씨앗에서 어렵게 싹을 티웠는가 본데 흙 알갱이도 별로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나는 왜 못 봤을까? 평균 주 2,3회를 오르내리는 곳인데... 더구나 생강나무를 발견한 곳은 내리막 구간이라 항상 발 딛는 곳을 확인하고 조심해서 저속으로 달리는 구간인지라 늘 살피는데도 노랗게 단풍이 들고서야 내 눈에 띄었다. 얼마나 작은 몸인지...
겨울이 되어 눈이라도 내리면 오솔길도 표시나지 않아서 투박한 등산화에 밟히기 십상이고 스치기만 해도 그 연약한 가지는 바로 부러질텐데...
사진만 두 장 찍고 그냥 내려갔는데 그 조그만 생강나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틀 뒤 아침, 이번에는 마음먹고 그 생강나무를 찾아보려고 내려가는 길에 내내 주의를 기울였건만 찾지 못했다. 다시 8부 능선까지 두 번이나 더 오르내렸으나 그 사이에 노랗게 단풍 든 잎이 떨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노란 잎은 떨어지고 이쑤시개보다도 짧고 가는 가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또다시 3일 후, 이번에는 꼭 찾고 말리라 다짐하며 내리막길 초입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집중해서 찾다가 나뭇잎을 몇 장 모아 쥐고 쌓여있는 낙엽을 쓸면서 찾았다. 빠짐없이 다 쓸면서 내려왔건만 결국 헛수고만 하고 말았다. 운 좋게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기고 봄에 새 잎을 틔울 수 있을까?
첫 돌을 지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려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양지회
고양지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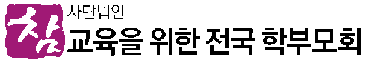 고양지회
고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