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글 나눔 | 몽골 여행기 1
페이지 정보
고양지회 작성일17-07-12 09:50 조회857회 댓글0건본문
몽골기행(몽골 사람들) -1부
박병희(흙마음, 역사모)
음력설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 에코샵홀씨에서 ‘몽골야생동식물탐사’ 안내 메일이 왔다. 열어보니 탐사내용과 11박 12일의 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안내문에는 몽골 북부의 광대한 타이가(북방 침엽수림)숲, 흡스걸 호수, 철새들의 천국, 다르하드 초원의 독수리들, 야영, 발걸음을 멈추게, 눈길을 빼앗으며, 경이로움, 다양한 동식물, 불편한 여행, 평생 간직될 추억 등의 표현이 나열되어 있다. 다분히 도발적이라 할 만한 초대장이다. 아니면 위협적이거나 매혹적인...
나는 그 중에서도 ‘불편한 여행’ 이라는 말에 걸려들었다. 그리고는 12명 선착순이라는 말에 참지 못하고 바로 신청서를 보냈다. 패키지 여행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몽골의 진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물이 있지만 너무나 차가워서 절대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으니 ‘물 없이 하는 샴푸’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래저래 난 준비하지 못했다. 불편한 여행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열흘간 떡진 머리로 버텨낼 각오를 해야 하나?
대한항공에서 매일 울란바토르 직항이 있을 만큼 왕래가 많고 또 관광객도 많으니 흔한 몽골여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련다. 일정의 줄거리만 살짝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박이고, 도착하자마자 게르 숙소에서 1박, 다음 날 호텔에서 1박, 그 다음에는 6일 내내 야영, 오는 길에 호텔 1박, 게르 숙소 1박을 했다. 야영을 하니 당연히 세 끼를 직접 해먹어야 했다. 하루하루 시어지는 김치와 감자, 마늘, 된장, 고추장 등으로. 쌀과 라면, 빵과 잼, 등도 준비되었다. 라면스프가 마법의 가루로 격상되고 귀한 그것을 반개씩 찌개에 아껴가며 넣고 순식간에 변한 찌개 맛에 감탄했다. 6일 야영 내내 소박한 메뉴에 빠지지 않는 보드카뿐이었지만 뭐든 맛있고 고맙게 먹었다.
불편한 여행이라는 말에 매료된 만큼 각오를 하고 갔으니 불편한 잠자리, 추위, 더위, 취사, 등등은 당연한 일이다. 가는 길, 오는 길에 포장도로는 하루씩만 타고 줄곧 비포장도로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대이상이었다. 운전자 두 사람 빼고도 15명과 개인짐, 6일간 18명이 먹을 식재료, 취사도구, 물 등을 실은 25인승 작은 버스는 얼마나 비좁고 불편하던지, 덜컹거리면 뒤편에 쌓아올린 짐이 앞 사람에게 쏟아지고, 윗선반의 짐이 떨어져서 아래 승객의 머리를 친다. 숙소에 도착하면 창문을 통해서 짐을 하나씩 내리면 아래에서 받고 몇 사람이 나란히 옆으로 서서 짐을 이어 나른다. 그나마 그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감당을 못해 그 다음 날부터 세 대의 차에 나눠 탔다. 러시아제 군용차를 개조한 호르곤차는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뒤쪽에는 세 개씩 좌석이 서로 마주보게 놓여져 있고 차의 양쪽 가장자리로는 손잡이가 달려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하도 흔들리니까 손잡이에 매달려서 용을 쓰느라고 팔에 쥐가 났다는 둥 호강에 받친 소리들을 한다. 하필 내가 탄 1호차에는 손잡이조차 없어서 우리는 여차하면 두 손바닥으로 차 지붕을 떠받치고 용을 썼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차가 요동을 치면 미안해 할 여가도 없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에게 온 몸이 그대로 날아가 덮쳐버린다. 비포장인데도 속도는 도로상태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나 같으면 저런 길을 저런 속도로는 절대로 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정도니까 롤링은 기본이고 피칭에다 두 가지가 희한한 조합을 이루면 차에 탄 사람들은 키에 얹힌 곡식이나 다름없다. 들까불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사지와 몸통과 머리가 따로 논다.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도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은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삼 알게 되었다. 사십대 후반이 한, 두 명이고 80, 70, 66, 나머지 모두 50대인데 공식적으로 허리에 탈났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다.
세세한 이야기는 다 쓸 수도 없고 또 읽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으실 테니 이번 여행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나 써볼까 한다. 한 번의 여행에서 같은 주제로 에피소드가 5가지나 생기는 일도 흔치 않을 테니 말이다. 그 공통의 주제는..... 구조(救助)다.
에피소드 1. 폰 구하기
여행 삼일 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첫 날, 얼마 가지 않아서 돌무덤이 있었다. 그림이 새겨진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돌무덤이 여러 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꽤나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있는 곳인지 화장실도 있었다. 판자로 된 1인실인데 문도 제대로 달려있는 화장실이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설명도 간단히 듣고 사진도 찍고 막 출발하려는데 누군가가 화장실에 갔다가 폰을 빠트렸단다. 케이스에서 빠져나가면서 매끈한 몸통만 빠졌고, 빠지면서 배터리까지 분리되어 같이 빠졌다고. 게다가 화장실이 아주 깊다고 한다. 하는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건지겠다고 남자들이 몰려다닌다. 아니, 손잡이도 없고 뭐 하나 걸릴 것 없는 몸통만 빠진 폰을 어찌 건진다고 이 야단일까. 시간만 낭비지.
그런데 몽골인 운전기사 중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이다. 주변에서 긴 판자막대기를 주워 오더니 페트병 목 부분을 잘라내고 몸통 부분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내고는 그걸 막대기에 끼우고 못으로 고정시켜서 폰을 건지려고 애를 쓴다. 처음에는 페트병이 너무 좁아서 실패, 이번에는 더 큰 병을 구해서 자르고 만들어서 다시 시도한다. 냄새나는 것을 받아야 하니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서 손에 쥐고 대기 중이다. 나는 차마 말은 못해도 그걸 어찌 그 페트병에 끼울 수가 있나? 보나마나 실패지 하고 구경만 했다. 1인용 화장실이라 좁아서 한 사람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난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다. 어두워서 손전등으로 아래를 드려다 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몇 번씩 실패를 하면서 한참을 애쓰던 그 운전자가 각도를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긴 막대기를 꺼내고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가운데 폰이 올라왔다. 비닐봉투를 뒤집어서 쥐고 대기하던 사람이 받으려고 다가가고 나는 그 장면을 찍으려고 폰을 들이댔다. 그런데 그 페트병에 어찌나 꼭 맞게 폰이 끼어있는지 비닐봉투를 낀 손으로 빼는데 한참이 걸렸다. 빼는데도 이렇게 힘 드는데 그 깊은 화장실 바닥에서 어떻게 여유도 없는 공간에 그것을 끼워 담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오물이 묻어있지 않았다. 이럴 수가? 알고 보니 워낙 그곳 기후가 건조하고 또 비포장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오물이 말라서 다행히 가라않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가 놀라워하고 있는 동안 그 운전자는 배터리까지 건져 내놓아서 우리 모두는 아낌없는 박수를 치며 감사를 보냈다. 그 운전자는 3호차를 운전하는 ‘처머’라는 이름을 가진 사십대 초반의 몽골인이다.
박병희(흙마음, 역사모)
음력설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 에코샵홀씨에서 ‘몽골야생동식물탐사’ 안내 메일이 왔다. 열어보니 탐사내용과 11박 12일의 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안내문에는 몽골 북부의 광대한 타이가(북방 침엽수림)숲, 흡스걸 호수, 철새들의 천국, 다르하드 초원의 독수리들, 야영, 발걸음을 멈추게, 눈길을 빼앗으며, 경이로움, 다양한 동식물, 불편한 여행, 평생 간직될 추억 등의 표현이 나열되어 있다. 다분히 도발적이라 할 만한 초대장이다. 아니면 위협적이거나 매혹적인...
나는 그 중에서도 ‘불편한 여행’ 이라는 말에 걸려들었다. 그리고는 12명 선착순이라는 말에 참지 못하고 바로 신청서를 보냈다. 패키지 여행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몽골의 진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물이 있지만 너무나 차가워서 절대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으니 ‘물 없이 하는 샴푸’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래저래 난 준비하지 못했다. 불편한 여행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열흘간 떡진 머리로 버텨낼 각오를 해야 하나?
대한항공에서 매일 울란바토르 직항이 있을 만큼 왕래가 많고 또 관광객도 많으니 흔한 몽골여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련다. 일정의 줄거리만 살짝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박이고, 도착하자마자 게르 숙소에서 1박, 다음 날 호텔에서 1박, 그 다음에는 6일 내내 야영, 오는 길에 호텔 1박, 게르 숙소 1박을 했다. 야영을 하니 당연히 세 끼를 직접 해먹어야 했다. 하루하루 시어지는 김치와 감자, 마늘, 된장, 고추장 등으로. 쌀과 라면, 빵과 잼, 등도 준비되었다. 라면스프가 마법의 가루로 격상되고 귀한 그것을 반개씩 찌개에 아껴가며 넣고 순식간에 변한 찌개 맛에 감탄했다. 6일 야영 내내 소박한 메뉴에 빠지지 않는 보드카뿐이었지만 뭐든 맛있고 고맙게 먹었다.
불편한 여행이라는 말에 매료된 만큼 각오를 하고 갔으니 불편한 잠자리, 추위, 더위, 취사, 등등은 당연한 일이다. 가는 길, 오는 길에 포장도로는 하루씩만 타고 줄곧 비포장도로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대이상이었다. 운전자 두 사람 빼고도 15명과 개인짐, 6일간 18명이 먹을 식재료, 취사도구, 물 등을 실은 25인승 작은 버스는 얼마나 비좁고 불편하던지, 덜컹거리면 뒤편에 쌓아올린 짐이 앞 사람에게 쏟아지고, 윗선반의 짐이 떨어져서 아래 승객의 머리를 친다. 숙소에 도착하면 창문을 통해서 짐을 하나씩 내리면 아래에서 받고 몇 사람이 나란히 옆으로 서서 짐을 이어 나른다. 그나마 그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감당을 못해 그 다음 날부터 세 대의 차에 나눠 탔다. 러시아제 군용차를 개조한 호르곤차는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뒤쪽에는 세 개씩 좌석이 서로 마주보게 놓여져 있고 차의 양쪽 가장자리로는 손잡이가 달려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하도 흔들리니까 손잡이에 매달려서 용을 쓰느라고 팔에 쥐가 났다는 둥 호강에 받친 소리들을 한다. 하필 내가 탄 1호차에는 손잡이조차 없어서 우리는 여차하면 두 손바닥으로 차 지붕을 떠받치고 용을 썼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차가 요동을 치면 미안해 할 여가도 없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에게 온 몸이 그대로 날아가 덮쳐버린다. 비포장인데도 속도는 도로상태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나 같으면 저런 길을 저런 속도로는 절대로 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정도니까 롤링은 기본이고 피칭에다 두 가지가 희한한 조합을 이루면 차에 탄 사람들은 키에 얹힌 곡식이나 다름없다. 들까불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사지와 몸통과 머리가 따로 논다.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도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은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삼 알게 되었다. 사십대 후반이 한, 두 명이고 80, 70, 66, 나머지 모두 50대인데 공식적으로 허리에 탈났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다.
세세한 이야기는 다 쓸 수도 없고 또 읽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으실 테니 이번 여행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나 써볼까 한다. 한 번의 여행에서 같은 주제로 에피소드가 5가지나 생기는 일도 흔치 않을 테니 말이다. 그 공통의 주제는..... 구조(救助)다.
에피소드 1. 폰 구하기
여행 삼일 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첫 날, 얼마 가지 않아서 돌무덤이 있었다. 그림이 새겨진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돌무덤이 여러 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꽤나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있는 곳인지 화장실도 있었다. 판자로 된 1인실인데 문도 제대로 달려있는 화장실이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설명도 간단히 듣고 사진도 찍고 막 출발하려는데 누군가가 화장실에 갔다가 폰을 빠트렸단다. 케이스에서 빠져나가면서 매끈한 몸통만 빠졌고, 빠지면서 배터리까지 분리되어 같이 빠졌다고. 게다가 화장실이 아주 깊다고 한다. 하는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건지겠다고 남자들이 몰려다닌다. 아니, 손잡이도 없고 뭐 하나 걸릴 것 없는 몸통만 빠진 폰을 어찌 건진다고 이 야단일까. 시간만 낭비지.
그런데 몽골인 운전기사 중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이다. 주변에서 긴 판자막대기를 주워 오더니 페트병 목 부분을 잘라내고 몸통 부분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내고는 그걸 막대기에 끼우고 못으로 고정시켜서 폰을 건지려고 애를 쓴다. 처음에는 페트병이 너무 좁아서 실패, 이번에는 더 큰 병을 구해서 자르고 만들어서 다시 시도한다. 냄새나는 것을 받아야 하니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서 손에 쥐고 대기 중이다. 나는 차마 말은 못해도 그걸 어찌 그 페트병에 끼울 수가 있나? 보나마나 실패지 하고 구경만 했다. 1인용 화장실이라 좁아서 한 사람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난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다. 어두워서 손전등으로 아래를 드려다 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몇 번씩 실패를 하면서 한참을 애쓰던 그 운전자가 각도를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긴 막대기를 꺼내고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가운데 폰이 올라왔다. 비닐봉투를 뒤집어서 쥐고 대기하던 사람이 받으려고 다가가고 나는 그 장면을 찍으려고 폰을 들이댔다. 그런데 그 페트병에 어찌나 꼭 맞게 폰이 끼어있는지 비닐봉투를 낀 손으로 빼는데 한참이 걸렸다. 빼는데도 이렇게 힘 드는데 그 깊은 화장실 바닥에서 어떻게 여유도 없는 공간에 그것을 끼워 담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오물이 묻어있지 않았다. 이럴 수가? 알고 보니 워낙 그곳 기후가 건조하고 또 비포장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오물이 말라서 다행히 가라않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가 놀라워하고 있는 동안 그 운전자는 배터리까지 건져 내놓아서 우리 모두는 아낌없는 박수를 치며 감사를 보냈다. 그 운전자는 3호차를 운전하는 ‘처머’라는 이름을 가진 사십대 초반의 몽골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양지회
고양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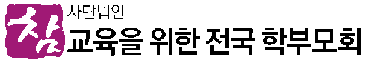 고양지회
고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