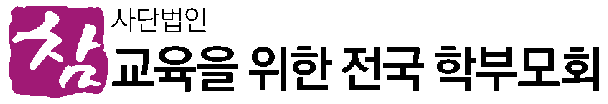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3년 5월호/377호] 마중물_자신에게 묻는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교육이 되는가?(12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3-05-10 14:03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자신에게 묻는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교육이 되는가?

나는 농촌 중학교 수학교사다.
나는 서울 강남 중학교 지리교사다.
지리교과(혹은 수학교과)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아이들을 깨워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에 말이다. 문제의 답이 뭘까? 모든 교실이 하나 같이 EBS 수업을 따라 하면 그게 답이 될까? 하늘로 머리 둔 교사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여 아이들의 눈을 밝히는 교육의 실천적 원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실천적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는 없을까? 교육의 길? 교육의 본질이 가리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걸으며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 이정표는 하나가 아닐 터이고, 그렇다면 이정표는 전리가 아닌 일리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겠지, 일리 있는, 이치에 닿는 reasonable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는 ‘탐구자’의 자세, 그 교사의 ‘교육방법론’ 실천이 교육이라고 선언하면 어떨까?
이치에 맞다는 것은, 교육의 맥락에서 아이들의 것인 학습의욕이 매개되지 않는 학교교육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 때 교사들은 아이들의 것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는’ 교직이 되겠지. 교육의 목표는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사는 그 목표를 도달점으로 진술하지는 않는다.
도달점으로 진술하면서 교육이 귀에 쏙쏙 들어가는 답을 주는 요령으로 축소되었다. 시험이 목표 대신 자리를 꿰차면서, 교육이 아이들을 판정하여 분별하는 체제로 고착되었다. 전문가 교사와 학습을 의욕하는 아이들의 관계가 사라졌다. 아이들의 성실과 유능을 추궁하는 교실 관계가 교육현장이 되었다. 교육이 농촌과 서울을 가르고 중요 교과와 주변 교과를 갈랐다. 35년 전 아니 60년 전, 우리 교사들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외친 이유가 실종된 교육을 찾으려는 갈망, 행동이었을 것이다.
온 동네가 고기를 잡는다. 저마다 역할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 문제는 이웃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화의식’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 교육의 대상이고 목표라는 뜻일 것이다. 그 빛나는 역사를 흔적도 없이 지우려는 듯, 고기를 잡아주는 ‘맞춤형 인재 맞춤형 교육’이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누가 싸울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인가? 교육방법론 실천이 교육이라고 굳게 믿는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답-진도-속도 경쟁 프레임 해체 교육과정 작업에 열중하는 전문가 교사의 땀과 눈물이 교육을 만들어낸다. 그 교사는 당연히 학생평가권을 돌려받으려 한다. 전문가 교사에 의 한 교육 통제,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마 250년 전에 교육은 당대 최고 지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시대의 지성 그 자체 ‘민초의 외침’ 아닌가. 현대적 용어로 시대의 지성은 전문직인 교직을 지칭한다.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도 내게 다가 올 것이다. 오늘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의 상태이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학교에 간다’(농촌 중학교 과학교사, 오태희).
충분한 것만 하자.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다.
김민남 (경북대 명예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