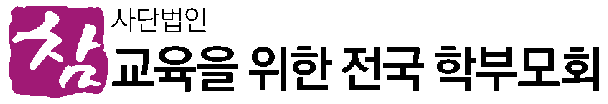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3년 8월호/380호] 어린이 · 청소년 인권_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사람만 남았다(13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3-08-09 12:03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
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사람만 남았다
몇 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부모와 함께 시청한 적이 있다. 그때 부모는 ‘때릴 거면 왜 입양을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나도 어릴 때 부모에게 꽤나 맞고 자랐는데, 부모의 반응이 낯설었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이름)아 미안해’라는 SNS 릴레이에 동참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지 궁금했다. 남 일처럼 미안하다고 말하는 SNS 릴레이 물결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때리는 건 소수의 학대 가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길을 가다가도, 학교나 학원, 시설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을 때리거나, 신체적인 벌을 주는 것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는 ‘나는 저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때린다’, ‘저렇게 작은데 때릴 데가 어딨다고’, ‘친자식이 아니니까 저러지’ 같은 말을 내뱉는다. 아동학대를 극단적인 사례라고 특정하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교육, 통제를 목적으로 때리는 것을 딱히 ‘학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한국의 다수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교사가 학생에게 일상적으로 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면 주로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만을 떠올린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폭력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생활부장 교사가 있었다. 그 교사는 쉬는 시간마다 학교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온 학교를 누비고 다녔다. 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피해 사실과 속마음을 털어놓을수록, 알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돌이켜보니 오히려 학교에서 나를 가장 많이 때린 사람은 바로 그 교사였기 때문이다.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학생생활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도, 매로도 학생들을 때렸다. 그 교사는 ‘폭력’에 반대해서 열심히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애들은 싸우면 안 되지’,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안 되지’ 하며, 학생들의 행동만을 문제시하고 엄중 처벌하는 이중 잣대를 갖고 있던 것이었다.
아동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내가 중학생 때 겪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교사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학대 사례만을 문제 삼는 것,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만을 ‘학교폭력’이라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닮은꼴이다. 누군가의 폭력은 교육이라며 용인되고, 어떤 폭력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 괜찮다고 하는 사회에서 오직 몇몇 심각한 경우에만 초점을 두고 법을 바꾸고 만드는 것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공간에서 겪게 되는 폭력을 막을 수 없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정말로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폭력으로 어린이·청소년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려면 어린이·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애들은 때려야 한다’라며 체벌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특히 소위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사례가 소개되면 더욱 그런 목소리들이 커진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이 사회 곳곳에서 ‘때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정도와 목적에 따라 어떤 폭력은 용인되는 이상, 어린이·청소년은 학대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상대는 아동학대로 죽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상에서 만나 함부로 대하는 어린이·청소년 모두여야 한다.
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