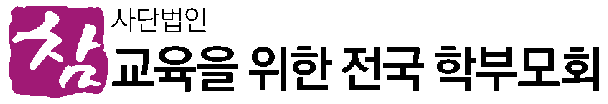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2년 1월호/362호] 교육현장_20대 청년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방법(3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1-05 09:10 조회1,646회 댓글0건본문
20대 청년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방법
어려운 세상살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버는 돈은 뻔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여러 길들을 살피는데, 봐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렇다. 누구는 비트코인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누구는 인터넷방송을 해서 잘 나간다느니,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배가 아프지만 그래서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 길들이 보편적이지 않은 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들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이 많이 좌우하는 부류에 있기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다.
요즘 세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처럼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대표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냥 내가 느끼는 바일 뿐이니 ‘생각’이라고 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나쁘냐고 하면 솔직히 운이 따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배가 아플 뿐,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알고 있다. 노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얼마나 모아야 남들 같은 집에 살 수 있는지.
아파트 천국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통계가 45.6%라고 한다. 작년 자료이니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쯤일 거다. 이 숫자는 많은 걸 시사한다. 45.6이면 느끼기로는 그냥 절반이다.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거다.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 나도 어릴 때가 있었다. 과거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누가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이런 걸 진짜 구분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은 빌라였는데, 그냥 놀러 가면 친구랑 재밌게 놀 뿐 그 외의 것들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때를 회상하면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친구 집은 얼마였을까?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우리 집이 걔네 집보다 잘 사는 건가? 물론 이런 생각이 회상의 중심축으로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섞여든다는 게 심각한 것 같다. 친구와 내 부모의 재력을 비교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냔 말이다.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에야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런데 뉴스에서 보기로 요즘 애들은 이런 비교가 디폴트라고 한단다. 내가 요즘 애들로 살아보지 않아서 뉴스에서 전한 이야기 하나로 요즘 애들을 다 아는 듯 이야기하는 것 같아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휴먼시아거지, 빌라거지, 전세거지, 뭐 이런 말들이 아주 어린 애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차별은 아주 강력한 금권을 손에 쥔 0.001%의 재벌이 통계의 나머지 숫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조금 더 나은 50%가 그보다 조금 못한 50%를 차별하는 게 실제로는 보편적인 차별이었던 것이다. 그 불합리하고 추잡스러운 재보기에서 내가 자유롭냐고 하면 슬프게도 아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나도 친구를 재보았으니까. 아무튼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런 세상의 일원이 된 우리에게 아파트 말고 다른 선택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차별을 감수하겠다는 순응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아파트에 살려고 한다. 아마 젊은 직장인들의 꿈을 물어본다면 대개 그 머릿속에 제일 먼저 아파트가 떠오르지 않을까?
국평오를 아십니까?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이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쉽냐. 45.6%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쉽지 않을까? 인터넷 유행어 중에 국평오라는 말이 있다. 수능에 빗대 만들어진 말인데 국민의 평균은 오등급이라는 거다. 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거의 다 수능을 치른 경험이 있다. 거기서 오등급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알면 오등급은 거저먹기다. 아무것도 아닌 오등급, 45.6%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숫자, 대충 맞물릴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전혀 아니다.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아주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다. 나도 어릴 때는 그냥 대충 살고, 대충 노력하면 엄마 아빠가 사는 것 같은 집 한 채 마련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십억이라고 한다. 뭐 눈 돌아가게 비싼 강남의 아파트들도 있으니 이런 평균값이 만들어졌겠지 만, 평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남들보다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라는 거다. 그런데 십억이 중간이라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까마득한 금액이다.
이십대의 고충
옛날에 그러니까 한 6~7년 전이다. 대학생 이학년 때인가, 군 입대를 앞에 두고 돈을 좀 벌어보려고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다. 천안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엔 내 또래는 거의 없고 아버지뻘의 아저씨들이 대다수였다. 거기서 만난 한 아저씨가 기억이 난다. KT에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잘렸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스물한 살이었던 나랑 받는 돈이 거의 똑같았다. 거기까지였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기억에서 지워졌을텐데, 아직도 기억에 남은 것은 그 아저씨가 한 말이었다. 아들이 요번에 결혼을 하는데, 세종시에 집을 해주려고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했다. 세상에 얼마나 인상적인 말이었으면 그 아저씨의 아들이 어디에 터를 잡을 건지, 그것까지도 기억이 날까.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말의 전체적인 인상은 한심하다였다. 성인이 됐으면 자립해야지, 노가다 일하시는 아버지 힘을 빌려 집을 마련하고 하느냔 것, 그것이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내가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생각이 더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이건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사회 초년생이 십억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나라에서 출산율을 들먹이며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결혼을 부추기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한다. 자기 애가 휴먼시아거지, 전세거지, 빌라거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을까? 적어도 나는 싫다. 내 삶이 잘 풀려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마 절대 낳지 않을 것 같다.
자기 혼자 살기에도 힘이 부친 세상에 아이까지 건사하는 건, 보통 정신으로는 힘든 일인 것 같다. 누가 그랬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물리적인 공간을 소유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결국 찾게 되는 건 가상의 공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게다가 그 가상의 공간이 그다지 외로운 것 같지도 않다. 홀로 세상을 견디는 게 외로워 보여도 그 외로움을 가상에서 공유하는 또 다른 ‘나’들이 많으니까.
이십대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 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등등.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미디어가 비춰준 과거의 편린들은 너무나 열악하고 조잡했으니까. 누구는 그때는 더 잘될 거란 희망이 있어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때를 살지 않아서 그 말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다.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내 인생을 다 살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구둣발 들이미는 행태는 조금 그렇다. 이 순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유독 짙게 떠오른다.
김진형 (28세 청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