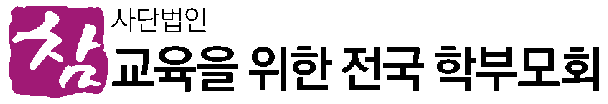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3년 1월호/374호] 어린이·청소년 인권_여전히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인 사회(13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3-01-17 10:32 조회1,033회 댓글0건본문
여전히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인 사회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20년 11월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개선 캠페인’을 해 왔다. 캠페인을 알리는 과정에서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라는 포스터를 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인권 교육 자리에서 소개하곤 한다. 포스터의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님, -씨)을 사용하십시오.”라는 문장을 보고 교육 참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 길에서 처음 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것이다. 청소년이 모두 학생이 아닌 것은 알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다는 것이다. “저기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다며 “저기 학생~”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한다. 그 정도면 되는 문제일까?
나 역시, 평소에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어이, 학생 뭐 하나만 물어보자” 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부탁이나 도움을 청하는 용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덥석 부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만해서는 아닐까. 교육 참여자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어떻게 걸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 “저기요, 죄송한데요.”라고 한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똑같이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부탁이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더라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이, 성별 등을 추측하여 호칭을 부르는 일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어린 사람에게도 최대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게 되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교사가 나를 전학생으로 착각한 적이 있다. 대뜸 “전학생이야? 몇 학년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 왔다. 강의가 있어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고 나이가 어려 보여서 그런줄 몰랐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근데 선생님은 아니고 언니 같다.”고 하며 웃어넘겼다. 한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님’이 자주 쓰이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음을 느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비청소년들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한다.
막상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존칭과 존대를 하면 그 사람이 더 불편해한다, 청소년과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경험담을 늘어놓는 이들이 종종 있다. 이제까지의 관계가 말 하나로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성평등을 강조하게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반말 등 하대를 해도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속에 어린 사람을 평등하게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위치시키는 차별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어린 사람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문화와 함께 일상 언어 문화도 달라질 수 있고, 일상 언어 문화 속 차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나이 평등도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면, 참여자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차별을 찾은 뒤 늘 ‘어른들과 어린이는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어린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