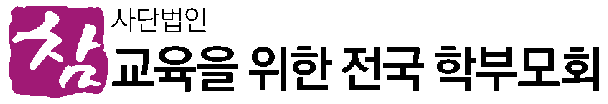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2년 8월호/369호] 세종지부_6월 특별 전시회 - 4·16 세월호 참사 8주기를 기리며 (8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8-08 17:11 조회1,100회 댓글0건본문
6월 특별 전시회
4·16 세월호 참사 8주기를 기리며

6월 7일 세종시 교육청 로비에서는 특별한 전시회 개막식이 있었다. 4·16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이해 55명의 작가가 붓으로 그 날의 아픔을 글씨에 생생하게 담은 작품이 전시됨을 알리는 날이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이하 세종참학)는 해마다 세종시의 연대단체와 4·16 행사를 열고 있었다. 4월 16일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만큼은 많은 시민들이 그날을 기억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세종참학 집행부는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잠시라도 되새길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기획부터 시작해 준비를 하는 시간은 거의 한 달 정도 된다.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아픔 속에 보낸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 그 배는 이름도 세월호일까? 이 배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태어난 것 같다.
가슴 먹먹해지는 마음을 추스르고 준비하던 중 올해 2022년에는 세월호 관련 손글씨 작품이 전국을 순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종 손글씨 연구소의 김성장 선생님과 55명의 작가분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 백 개 이상의 손글씨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에 세종참학도 이번 세월호 행사는 4월 16일 정기행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전시회와 함께 두 번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 전시회를 세종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이 작품을 전시하는가였다. 시민단체의 특성상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 그런 곳을 찾아 고민하던 중 세종시 교육청과 의논하니 감사하게도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1층 로비를 내어주었다. 전시회를 시작하기 전 작품을 설치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우리 집행부들이 세종 손글씨 연구소의 선생님들과 함께 설치를 시작하자 시민연대 박창재 사무처장님과 전교조의 이영길 세종지부장님도 설치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주셨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바쁜 업무 중에 나와 주셨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 덕에 순식간에 감동적인 손글씨들이 세종시 교육청 1층 로비를 꽉 채웠다. 작품에 새겨진 글들은 이젤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교육청 직원들과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하고 10일 동안 다시 그날을 기억나게 해주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세종참학의 회원들도 많이 참석해주셨다. 전시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은 잊었던 기억인데 이날을 통해 상기할 수 있어 고마운 행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회원들은 작품에 새겨진 글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결국 눈물이 고여 차마 다 읽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가슴이 찢어지는 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당일 행사에 최교진 교육감은 “이 아이들이잊힐까 가장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구나!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은 그동안 세월호 행사를 준비하며 마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아이들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 마지막 전시를 끝내고 철거를 하던 그날은 더욱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였다. 이렇게 하면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등 여러 생각을 하며 작품을 내리고 이젤을 정리했다.
행사를 마치고 작품을 더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은 많았으나 다행히도 세월호 참사 손글씨 작품은 『그날을 쓰다』 책으로 전시회와 동시에 발간되었다. 이 후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억하게 해 줄 것이다. 이제 『그날을 쓰다』 대표작가 김성장 선생님의 서문 앞부분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그날을 쓰다』 서문
기억이 더 또렷해지기를 바라며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물에 잠겨가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전 국민이, 동시에, 그걸 보았다. 우리 모두 가만히 있었다. 발을 구르거나 소리만 지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각자의 몸뚱이를 스스로 두들기며 보고 있었다. 몸을 쥐어짜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텔레비전 앞에서 서성이며,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며, 우리도 가라앉고 있었다. 차가운 그 바닷속으로 우리 모두 침몰했다. 304명 중 250명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린 생명들이었다.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18살이라는 나이는 우리를 더 아프게 했다. 이제 막 자아를 형성하고 세계를 향하여 솟구칠 준비를 하는 학창 시절 마지막 여행길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다니.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재인 (세종지부 지부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