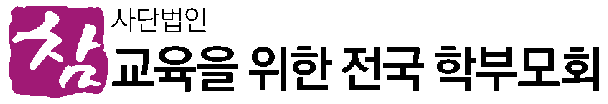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22년 7월호/368호] 미디어와 만나기_우리말 땅이름 (14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7-07 11:38 조회864회 댓글0건본문
우리말 땅이름

서산은 마을교육 공동체 교사 양성과정이 한창입니다. 저는 서산말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천안에서 서울로 27년을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지 10년만에 서산말 공부합니다. 우리말 지키자던 분위기가 시들해져 한자어와 영어에 밀려나는 걸 실감합니다. 언어 다양성이라지만 ‘생각 없음’에 대한 핑계로 들립니다. 다양성은 우리 말을 자주 써서 깊이를 더하고 지역 말을 일상 언어로 돌려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우리 말에 대한 관심은 이오덕 선생님이 쓴 『우리 글 바로 쓰기』를 읽으면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영어 번역투 문장’, ‘일본 번역투 문장’, ‘되다’, ‘의’ 같은 것들이 우리 말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바로 잡길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쯤 배우리라는 분이 쓴 책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를 읽었습니다. ‘밝다’가 ‘박’이 되고 ‘부루’가 되고 ‘비로’가 되어 백두산으로, 비로봉으로 우뚝 서는 이야기는 서사시 같습니다. 할미산이 할머니 산이 아니라 ‘큰 산’이고 독도는 ‘홀로 섬’이 아니라 돌뿐인 섬 ‘독섬’이었던 겁니다. 일본이 대나무 없는 독도를 ‘竹島’라고 쓰고 ‘다케시마’라고 읽는다니 ‘독섬’을 자기네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문득 『삼국유사』 김유신조가 생각납니다. 거기에 ‘아해(阿海)’와 ‘아지(阿之)’가 나옵니다. ‘아해’는 언니 보희(寶姬) 어릴 때 이름이고 ‘아지’는 동생 문희(文姬) 어릴 적 이름이랍니다. ‘어리숙해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 때문인지 ‘어린이’보다 ‘아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서산말을 배운다면서도 속으로는 바깥에서 뒤섞인 말투에 힘들었는지 사투리보다 지명에서 우리 말 찾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회피 본능인가 봅니다. 그나마 유재철이 쓴 『우리말 땅이름』이라는 책을 만났으니 덜 민망합니다. 매끄러운 문장으로 인문학 지식을 담아 지명 해설을 하니 술술 읽힙니다. 서울을 ‘漢陽’, ‘漢城’, ‘京城’이라고 썼지만 ‘한양’, ‘한성’, ‘경성’이라고 읽지 않고 ‘서울’이라고 했답니다. 신라 경덕왕 때(757년) 지명을 두 글자 짜리 한자로 바꾸었지만 민중은 한자음대로 동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천년 넘게 우리 말로 불렀던 겁니다. ‘내 고향 삽다리를 아시나요.’로 유명해진 삽다리는 ‘揷橋’라고 쓰지만 ‘섶나무’로 놓은 다리를 말한대요. 지명을 한자음만으로 읽는 버릇이 굳어 요즘 사람들은 ‘삽교’는 알지만 ‘삽다리’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어릴 적 옆 동네 이름이 ‘섭바탱이’였습니다. 어른들 흉내내서 비슷하게 발음은 하지만 도저히 글로는 적을 수 없는 동네 이름.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야 뜻을 어렴풋이 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섶다리를 만들 때 섶에 흙을 이겨 만드는데 흙이 강조가 되면 흙다리. 흙다리가 학다리로 바뀌어서 ‘鶴’이 지명 유래에 나오지만 섶다리와 관련이 있는 동네랍니다. 『우리말 땅이름』을 읽다 보면 우리 동네 이름을 따져봅니다. 무슨 말이었을까 자꾸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도 『우리말 땅이름』을 읽으면서 동네 이름 속 우리 말을 찾는 재미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심주호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