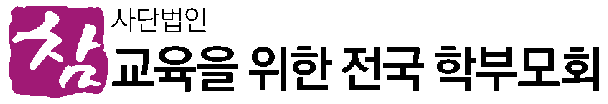학부모와인권 | 303호 새삼, 인권!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1-05 16:01 조회1,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삐끗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격한 통증이 몰려왔다. 입을 틀어막고 꺾인 발을 보는데 각도가 심상치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목골절이었다. 수술을 안 하는 대신 깁스한 발을 절대 땅에 딛지 않는 미션이 주어졌다. 깁스해도 안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목발을 짚고 깽깽이걸음으로 진료실을 나오는 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에게 도량 깊은 미소를 보냈다. “괜찮아. 이참에 좀 쉬면서 책도 실컷 읽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뭐.”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손바닥과 손목을 중심으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왔다. 목발 때문이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생활도 어그러졌다. 누웠다 일어서는 것이 곡예였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앉으려면 수십 번의 단절된 동작들이 필요했다. 가족이 깜박 잊고 밥을 안 해놓고 간 날에는 어떻게 해봐도 쌀을 퍼서 부엌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 밥을 굶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강행해보려 했던 교육과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다. 두 손은 목발을 쥐고 한발은 깽깽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했다. 교육은 커녕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팔 힘이 없는 노인이라면, 원래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했다. 몇 년 전 뇌성마비 장애인이 집에 불이 났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 사망했던 일이 눈물 나게 실감났다. 몸의 통증과 무기력은 나란 존재의 가치마저 위협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은 인권교육을 하며 목소리 높여 강조해왔던 사람의 ‘존엄성’을 비로소 진심으로, 진지하게 응시하는 순간이 되어 주기도 했다.
어느 정도 목발이 익숙해져서 조금씩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엇박자로 걷는 기이한 세상을 보게 됐다. 제도·문화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회라고 할 때, 개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하고 친절했다. 목발과 내 발을 보고는 모르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차례를 양보하고, 거북이처럼 느린 내 걸음을 기다려주었다. 그런데 제도·문화는 약자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장애인을 불에 타죽게 하고, 휠체어 좌석이 없는 비행기는 모두가 보는데서 승무원에게 안겨 화장실을 가게 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이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교도소 환자가 의사 한명의 진료를 기다리가 맹장이 터져 죽게 했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교통수단이 없어 일을 못하고, 누군가 밥을 해줄 때까지 굶고 있어야 했다. 휠체어를 대여했지만 동네의 상점들-커피숍, 식당, 미장원 등의 열에 아홉 이상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무용지물이었다. 할 수 없이 목발로 나가면 목발 짚은 사람이 열 수 없는 여닫이문 뿐이고 심지어 병원문도 그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없을 땐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어깨로 문을 밀며 한발로 깽깽 들어가야 했다.
타인의 친절과 선의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상태에선 누구도당당하기 힘들다. 그 불편한 마음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뻔뻔해져야 할 거다.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내 권리로서 교통수단이 주어지고 밥이 주어질 때, 나는 뻔뻔하지 않고 존엄할 수 있다. 엇박자로 스텝이 꼬인 사회를 진전시키는 건 인성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
조혜욱 (학부모상담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